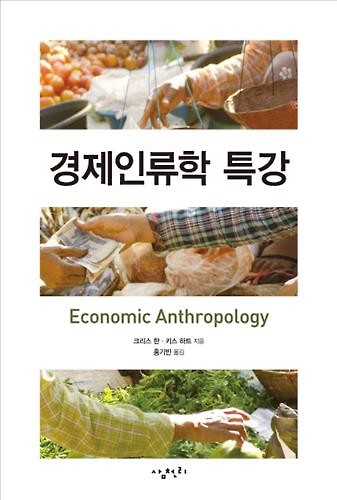경제인류학 특강
크리스 한·키스 하트 지음, 홍기빈 옮김
삼천리·1만7000원
경제학이나 인류학이라면 모를까, ‘경제인류학’이라니. 낯설다. 제목에 경제인류학이 들어간 국내 서적은 2010년에 나온 <경제인류학을 생각한다>(일조각)라는 번역서가 유일하다. 국내 사정은 그렇지만, 독일·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에서는 제법 연륜 있는 학문이라고 한다.
경제인류학은 인간의 경제 행위를 생산·교환·소비·효용 따위 추상적 개념으로, 온갖 숫자와 수식과 그래프를 동원해 설명하는 근대경제학의 ‘등잔 밑’에서 출발한다. 경제를 뜻하는 영어 단어 이코노미(economy)는 가정경제에 질서를 부여하는 행위, 자급자족을 뜻하는 고대 그리스어 ‘오이코노미아’(oikonomia)에서 왔지만, 서유럽에서 일어난 산업혁명 이후 노동 분업과 시장 문제를 뜻하는 개념어로 제한되고 변질되었다.
그 대신 경제인류학은 경제 주체인 인간을 중심에 놓는다. 그래서 탐구 대상은 ‘인간의 경제’다. 경제활동은 인간의 광범위한 욕구에서 비롯된다. 시장 거래로 충족되는 재화와 서비스에 한정되지도 않는다. 교육·안전·건강·환경과 같은 공공재, 인간의 존엄이나 권리, 행복 등이 당연히 포함된다. 시장에서의 교환과 ‘합리적 선택’ 이론만으로는 경제활동 전반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는 이유다. 근대 경제학이 그렇게 강조해온 시장 원리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그런 기제가 과연 있다면, 2008년 국제 금융위기 같은 것은 오지 않았을 것이다. 인류의 역사를 봐도 그렇다. 경제인류학이 ‘비공식 경제’로 간주되곤 하던 아프리카·멜라네시아·아메리카 원주민의 경제활동, 러시아의 블라트나 중국의 관시, 이슬람의 바자나 모로코의 수크 같은 비공식 경제활동에 주목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경제인류학 특강>은 애초 칼 폴라니를 추모하는 2006년 국제 학술대회에서 토의 자료(포지션 페이퍼)로 제출됐던 것이다. 2008년 국제 금융위기가 닥치기 직전이다. 주저 <거대한 전환>에서 시장 원리의 무차별적인 확장이 불러올 파국을 예견하며 근대 경제학의 맹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던 칼 폴라니를 기리는 책답게 저자들은 근대 경제학의 ‘뿌리’부터 건드린다.
그렇다고 저자들이 근대 경제학의 대체 학문을 모색하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경제’를 더 잘 설명하기 위해 “우리의 목적은 그저 이 두 학문(경제학과 인류학) 분야를 더욱 가깝게 만들고자 함이며, 이 때문에 경제학이나 인류학, 나아가 주류의 관점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에 설 수밖에 없다.”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협동조합 칼폴라니와 다원적경제론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협동조합 칼폴라니와 다원적경제론